기획
마지막으로 도자기(porcelain)가 진열되어 있다. 지금 유럽의 곳곳에 생산지 이름을 딴 도자기 브랜드가 유명하지만 처음 중국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할 당시, 유럽은 주석(tin)제품의 식기가 주종을 이루었다는데 중국의 도자기가 수입됨에 따라 돈 있는 귀족들은 너도나도 중국 도자기 수입에 열을 올렸다고 한다. 서양에서 china와 같은 단어를 쓸 정도로 중국하면 도자기였다.
유럽의 왕이나 귀족의 옛 저택을 관광해 보면 중국의 도자기가 많이 진열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중국은 옛날 玉이 많이 산출되어 황실이나 귀족은 玉으로 된 그릇을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玉器는 건강에도 좋고 쓰면 쓸수록 윤택이 나서 모두 좋아했다고 하는 데 하나의 흠은 玉의 생산이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玉은 주로 중국의 서쪽 서역지역(지금의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중국이 분할되고, 서역지역은 인근의 소수 민족이 장기간 점령함에 따라 비교적 풍부한 玉의 생산과 공급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공급은 없고 찾는 사람이 많아 玉의 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니 사람들은 玉器와 유사한 것은 고안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자기였다. 특히 도자기는 고령토(kaoline)같은 특수 흙으로 빚어 고온으로 구워낸 것인데 유약을 발라 빤짝거림이 마침 玉으로 만든 것과 진배없었다고 한다. 잘 씻겨지고 아름다운 무늬며 마음에 드는 그림도 넣을 수 있어 오히려 玉器보다 더 인기를 끌게 된 것 같다.
중국에서 도자기 문화가 가장 크게 발전한 때가 宋나라였다는데 宋은 나중에 지금의 중국 대륙의 동남쪽 일부분만 차지하였다고 하며 대부분 지방이 당시 북방의 소수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어 그 쪽으로부터 생산되던 玉이 전혀 반입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 도자기의 주산지는 黃山 인근의 경덕진 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玉이 산출되는 서역의 정반대 편에 있다.
세계역사가 그러하지만 중국역사도 전쟁(내전 혼란기)과 평화(통일 안정기)의 술래잡기 역사인데 혼란기에는 경덕진의 도자기를 굽는 요가 수시로 파괴되었다고 한다. 중국으로부터 도자기를 수입해오던 유럽 상인들은 중국이 전란으로 도자기가 더 이상 반출할 수 없게 되자 일본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일본은 조선과 7년 전쟁(임진왜란)을 치르고 난 후 당시 조선의 도공을 대거 납치해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도공이 있고 흙이 있으니 유럽상인이 원하는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었다. 지금도 일본 구주일대의 도자기 즉 야키모노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도 이와 같이 중국 도자기 산업의 흥망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三点셋트(차,비단,도자기)와 아편
하여튼 이 세 가지 물건이 유럽상인, 나중에는 영국상인이 집중적으로 수입해 갔던 물건이었다고 한다. 특히 茶(tea)는 영국사람들의 입맛을 완전히 잡아 놓았다. 태양이지지 않는 大英帝國의 유니온 재크旗와 함께 신대륙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茶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유럽의 돈(은화) 그 중에서 영국의 국부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영국은 중국에 팔 만한 물건이 없었다. 중국은 거대한 종합 국가로 완전 자급자족 경제로 보였다. 이것이 당시 동인도 회사를 거점으로 하는 영국상인으로서는 큰 문제였다.
다음, 전시장에는 아편이 전시되어 있다. 아편은 시커먼 진흙덩어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진흙을 舶來泥(foreign mud)라고 불렀다. 이 진흙덩어리(mud)가 어떻게 만들어져 중국까지 오게 되었을까. 인도의 동쪽 간지스 강의 중상류에 양귀비(poppy)가 흐드러지게 자라고 있다. 양귀비의 화려한 꽃이 지고 나면 씨주머니가 생긴다. 싸주머니 속에는 씨를 보호하고 나중에 싹이 틀 때까지 영양분으로 공급될 우유 빛깔의 찐득찐득한 물질(乳液)이 들어 있다.
현지 인도사람들은 예리한 칼로 씨주머니에 노련한 상처를 낸다. 너무 깊이 내면 씨주머니가 말라 버릴 수 있고 너무 얕게 내면 그 유액이 제대로 흘러 나오지 않는다. 흘러 나온 유액을 채취해서 한 곳에 모은다. 몇 번이고 씨주머니에 상채기를 내서 흘러나온 유액을 모은 것을 적절한 가공과정을 거쳐 둥글게 뭉친 것이 아편이다. 시커면 대포알처럼 생겼다. 이것들은 갠지스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 온다. 각지에서 생산된 아편 덩어리는 유럽상인들에게 경매에 붙여져 실려간다.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망고나무로 짠 상자(chest)가 제일 좋았다고 한다. 그 상자를 한 배 가득 싣고 다시 동쪽으로 항해를 계속한다. 곧 마카오에 도착하고 다시 마카오에서 珠江을 따라 虎門을 지나서 캔톤 즉 지금의 광주까지 가지고 온다.
(다음 호에서 계속)
유 주 열 (수요저널 칼럼니스트)
yuzuyoul@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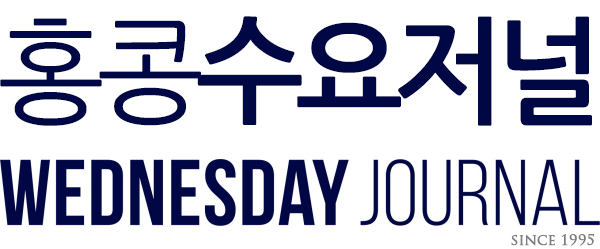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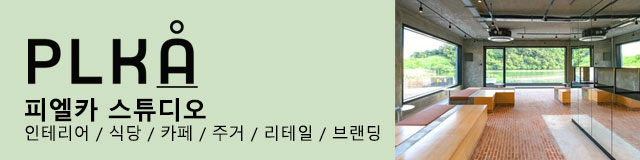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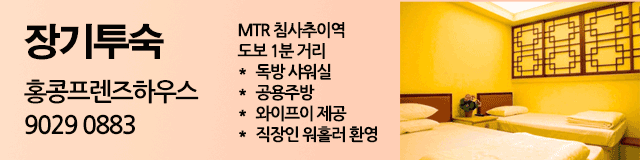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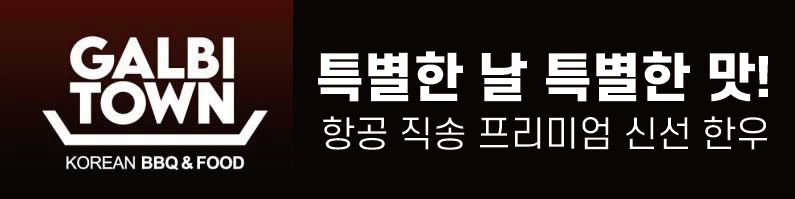




![[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 요리만큼 다양하다~! 홍콩의 양념장 (2) [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 요리만큼 다양하다~! 홍콩의 양념장 (2)](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3838053_80kQR6q5_4cd2e12ac4940725c6ce68927b715d98cfc7d388_118x78.png)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46)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300 (46)](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3673838053_gWhAjk5x_d950faab9e24c61bf35bca3b50f0b2093e00a54e_118x7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