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의 깊은 밤, 영준은 침사추이의 한 한적한 거리에서 기영을 만났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기영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나 한국 갈려고." 기영이 내뱉은 첫마디는 무거웠다.
기영이 짐을 싸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식당 숙소에서 함께 지내는 30대 중반의 부주방장 때문이었다. 그는 평소 사장에 대한 불평과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고, 워홀러들에게는 "철이 안 들었다", "예의가 없다"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의 술버릇이었다. 밤마다 뻗을 때까지 추태를 부리며 욕설을 내뱉다가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능청스럽게 주방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기영에게는 지옥 같았다.
영준은 선뜻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다. 기영의 처절한 상황에 비하면 영준의 일상은 평온한 편이었다. 좁은 숙소는 여전했지만, 사무실에서 경영 마인드를 갖춘 상사들과 다국적 직원들 사이에서 실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문 메일을 작성하고 문서를 정리하며, 영준은 스스로가 조금씩 회사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기영은 한숨을 내쉬며 토로했다. "식당 일이 힘든 게 아냐. 한국 사람들과 일하는 게 더 힘들어. 어디 상담할 곳도, 털어놓을 곳도 없다는 게 더 막막해."
반면 또 다른 워홀러 명호는 달랐다. 그는 초기부터 부주방장의 부당한 언행에 정면으로 맞서며 제 목소리를 냈고, 덕분에 부주방장도 함부로 명호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반전이 일어났다. 주방장 및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이 극에 달하자 사장이 결국 부주방장을 해고한 것이다. 나중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식당을 망치고 홍콩으로 도주하듯 건너왔으며, 쉬는 날이면 마카오를 드나들며 도박에 빠져 살았다고 했다. 장애물이 사라지자 기영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영준에게 기적 같은 제안이 찾아왔다. 인턴 생활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한국 지점의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연락이었다. 한국에서 6개월간 신입 교육을 마친 뒤 다시 홍콩으로 발령받는 조건이었다. 영준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함께 고생했던 희진 역시 한국으로 돌아가 싱가포르 마케팅 회사의 취업 관문을 뚫어냈고 , 기영과 명호는 워킹홀리데이를 6개월 더 연장해 다른 지점을 경험하며 저축과 여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물론 모든 이들의 결말이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일하다 다쳤고, 누군가는 도망치듯 귀국했으며, 취업을 미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이 청춘들은 홍콩 한인 사회에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주역들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도시인 홍콩에서, 젊은이들의 활기는 한인 공동체를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서툴고 아팠던 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훗날 홍콩 한인 사회의 든든한 주축이 되기를, 그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꿈꿔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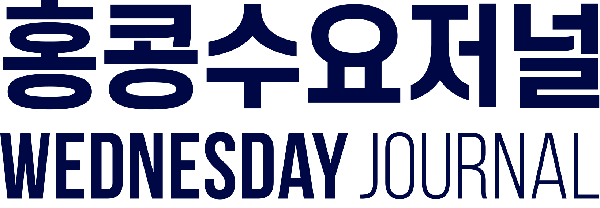








![한인 교육 현장을 가다 (4) 영재의 우뇌 발달 프로젝트! – 브레인나우 노유현 원장 [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 한인 교육 현장을 가다 (4) 영재의 우뇌 발달 프로젝트! – 브레인나우 노유현 원장 [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999599489_OuJy9V2X_9f13ae495ae31d942627c565f19cc320ee2b4369_118x78.jpg)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동량 보어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동량 보어](https://www.hksooyo.com/data/file/news/thumb-3420105580_a9ePUEzf_2992e492292655bd2ba240d5d12a4d320a390555_118x78.jpg)
